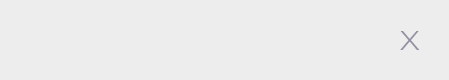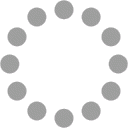Logo and Menu
연합뉴스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국내 연구진이 부작용은 줄이고, 사용 기간은 대폭 늘린 새로운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술을 개발했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은 나노의학 연구단 천진우 단장과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박장웅 교수 연구팀이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정현호·장진우 교수팀과 함께 뇌 조직처럼 부드러운 인공 신경 전극을 쥐의 뇌에 이식하고, 3D 프린터로 전자회로를 두개골 표면에 인쇄해 뇌파(신경 신호)를 장기간 송·수신하는 데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은 뇌파를 통해 외부 기계나 전자기기를 제어하는 기술이다.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몸이 불편한 환자에게 적용하면 자유롭고 정확한 의사 표현을 도울 수 있다.
뇌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감지하는 삽입형 신경 전극과 감지된 신호를 외부 기기로 송·수신하는 전자회로는 이 기술의 핵심이다. 연구진은 고형의 금속 대신 뇌 조직과 유사한 부드러운 갈륨 기반의 액체금속을 이용해 인공 신경 전극을 제작했다. 이 전극은 지름이 머리카락의 10분의 1 수준으로 얇고, 젤리처럼 말랑해 뇌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 다음 3D 프린터로 두개골 곡면을 따라 전자회로를 얇게 인쇄해 뇌에 이식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얇아 마치 문신처럼 이식 후에도 두개골 외관에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기존에는 딱딱한 금속과 반도체 소재로 이뤄진 전극과 전자회로를 사용해 이식 때 이질감이 크고, 부드러운 뇌 조직에 염증과 감염을 유발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뇌에 발생한 손상이 신경세포 간 신호 전달을 방해해 장기간 사용이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연구진이 구현한 인터페이스는 여러 개의 신경 전극을 이식할 수 있어 다양한 뇌 영역에서의 신호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고, 유선 전자회로가 아닌 무선으로 뇌파를 송수신할 수 있어 환자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연구진은 쥐 모델을 활용한 동물실험에서 체내 신경신호를 8개월이 넘는 기간 안정적으로 검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딱딱한 고체 형태인 기존 인터페이스로는 1개월 이상 측정하기 어려웠다. 박장웅 교수는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뇌전증 등 다양한 뇌 질환 환자와 일반 사용자에게도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지난달 27일 실렸다.
Copyright and Address
- Yonsei Advanced Science Institute
- PRIVACY POLI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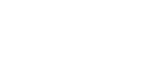
- ADDRESS IBS Hall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03722
- TEL +82-2-2123-4769 FAX +82-2-2123-4606
- E-MAIL ibs@yonsei.ac.kr
- Copyright © IBS Center for NanoMedicine,YONSEI UNIV.
ALL RIGHTS RESERVED.